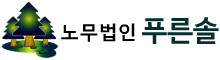과로성 질병으로 쓰러지고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이대로 좋은
노사정뉴스 ㅣ 기사입력 2014/07/29 [13:12]
업무상 과로로 쓰러진 근로자가 산재 승인을 받는데 그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요소가 있다.
그 중 하나가 과로기준인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2주 평균 60시간, 4주 평균 60시간을 정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고시이다. 이 고시는 2013. 7. 1.부터 시행되고 있다.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64시간이 되려면, 매일 10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하고도 이틀의 휴일근로를 더 했어야만 맞출 수 있는 수준이다.
12주 평균 60시간이 되려면 공휴일, 연차, 토요일 휴무없이 거의 매일 10시간 이상 일을 해야만 한다.
게다가 여기서 말하는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것을 말하므로 출근시간이 아침 10시이고 퇴근시간이 밤 10시인 식당 종사자라 할지라도 중간에 휴게시간이 3시간이라면 1일 9시간만 근로한 것이므로 토요일까지 꼬박 근무를 하였다고 할 지라도 54시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사실상 산재 과로기준에 미달하는 것이다.
이 기준의 실시로 말미암아 식당 일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아주머니나, 자동차 조립공장에서 일하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노동자, 경비반장으로 일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아저씨 등 등 수 많은 사람들이 산재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기준은 산재인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산재 인정을 가로 막고 있는 걸림돌이다. 이 기준이 만들어질 당시에도 산업보건의학계에서 평균 52시간 기준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무시되었다.
이 기준이 2013년 7월 1일에 실시된 후로 1년이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과로로 인해 뇌혈관질환으로 쓰러지고도 정작 과로성 재해로 인정을 받지 못해 재해자나 그 가족들이 고통의 어둠속을 헤메고 있는 실정이다.
그 두 번째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라는 곳이다. 이곳은 과로로 쓰러진 사람의 질병이 업무상으로 초래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곳에서 판정하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위촉한 사람들이라는데 있다. 즉 질병판정위원회가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의 입김에 좌우되는 종속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질병판정위원회는 쓰러진 근로자와 이를 조사 판정하는 공단 사이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재해자와 그 가족의 주장과 공단의 조사결과를 함께 놓고 비교 판단하여야 하는데 공단 조사 결과서만 놓고 판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내용은 행정소송에 있어서 거대한 벽과 같은 것이다. 위원회에서 다수의 의사와 전문가들이 판정한 것이 진정성이 있다고 보고 비록 소송과정에서 법원에서 조회한 감정의 소견이 다소 재해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온다고 해도 좀체로 그 판정을 뒤집는 판결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심지어 인정된다는 내용의 감정소견이 있다 손치더라도 긍정적인 재판 결과를 내 놓기가 매우 어렵다.
세번째 어려움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처리 스타일이다. 과거 노동부에서 1991년 이전 산재보험을 관장할 적에는 수사권한을 갖고 있는 노동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평가하여 과로 여부를 따져 승인을 해 주는 것이었는데, 공단으로 넘어 온 뒤로는 적극적으로 사건을 파헤치는 직원들도 소수 있는 반면, 대부분의 직원들은 "산재를 당한 사람이 산재임을 입증하기를 요구하고, 이것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는 재해자와 그 가족들이 주장했던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회사가 주장하는대로 과로 없었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산재를 당한 노동자, 특히 과로로 질병을 얻은 노동자는 지금 15도 이상 기울어진 운동장 아랫 쪽에 서서 윗쪽을 향해 공을 차고 있다고 본다. 아무리 열심히 공을 차도 골문턱에 도달하지 못하고, 턱에 숨이 찰 지경으로 겨우 골문 앞까지 공을 몰아 가더라도 공단에서 뻥차면 저 언덕아래에 쳐 박이고 마는 부조리한 운동장에서 경기를 치루고 있다.
25여년 산재보상을 전문으로 해 오고 있는 필자에게 밀려오는 이 좌절감은 너무도 억울하지만 견딜 수 있다. 하지만 질병을 입고도 산재인정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그 고통을 견뎌낼 수 가 없다. 생존의 벼랑끝에서 손에 쥘 아무것도 없다.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만나 "이 기준이 만들어질 때 왜 가만히 있었느냐?"라고 물으면 "몰랐어요"라고 말한다. 남의 일이 아니었는데 그 기준이 만들어지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마치 세상이 다 알아서 잘 해 주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에 사로 잡혀 당시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었다.
필자가 작년 봄 국회앞에서 과로기준 잘 못되었다고 유인물을 돌리고 1인 시위를 할 때에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 한정애 의원께서 열어 준 토론회에서 열심히 떠들었지만 노동계조차도 쓰러진 사람들을 향해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슬쩍 이 기준이 통과되었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족쇄는 그 때 이미 채워지고 있었던 것이다. 어찌도 이 세상이 이리도 모질고 냉혹하게 변해만 가는지...
독자들에게 묻고 싶다.
산재 과로성 질병 인정 제도 이대로 두어도 괜찮은가?
2014. 7. 29.
노무법인 푸른솔 대표노무사 신현종